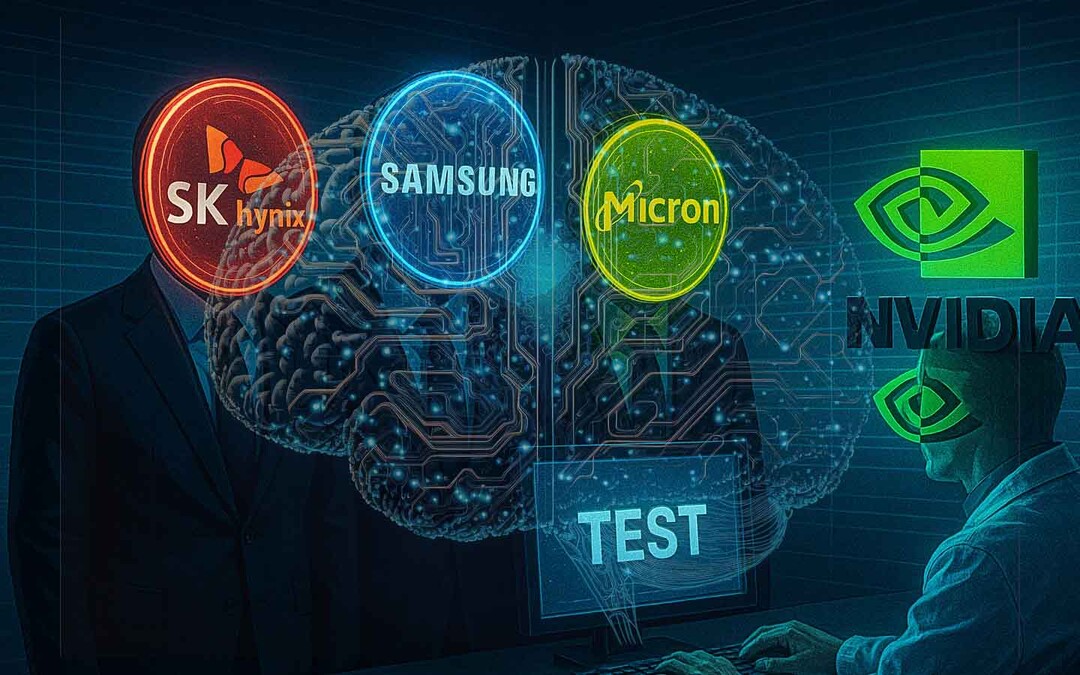
[예결신문=백도현 기자] 삼성전자가 자사의 6세대 고대역폭 메모리(HBM4) 생산과 관련해 모호한 입장을 취하면서 시장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국내외 언론들은 삼성전자 HBM4에 대해 “엔비디아의 예비 신뢰성 검증(qualification test)을 통과, 이르면 이달 말 사전 생산(PP, Pre-Production) 단계에 진입할 수 있다”고 보도해 왔다.
그러나 삼성은 “고객사 관련 사항은 확인할 수 없다”며 신중한 입장을 고수했다. 이에 28일 대만 언론 디지타임스(DigiTimes)는 이 같은 ‘보도와 침묵’의 괴리를 두고 삼성의 HBM4 공급 능력과 인증 속도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았다는 분석을 내놨다.
■ “테스트 통과” vs “확인 불가”
다수의 보도에 따르면 삼성은 7월 엔비디아에 HBM4 샘플을 납품했고, 해당 제품이 기초 프로토타입 평가 및 신뢰성 시험을 무난히 통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매체는 “8월 말 PP 진입 후 11~12월 양산(MP, Mass Production) 가능성”까지 전망했다.
하지만 삼성은 즉각 확인을 거부했다. 회사 관계자는 “고객사와 관련된 검증 절차는 언급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업계는 이를 NDA(비밀유지협약) 차원의 통상적 대응으로 볼 수 있으나, 경쟁사들이 명확한 로드맵을 제시하고 있는 상황에서 삼성의 ‘침묵’은 오히려 검증 지연 신호로 해석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반면 SK하이닉스는 HBM4 분야에서 가장 앞서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올 상반기부터 주요 고객사에 12-Hi·16-Hi HBM4 샘플을 공급했으며, 올 하반기 양산 준비 완료를 공식화했다. 이미 HBM3E 12-Hi(36GB)는 지난해 9월 양산을 개시했고, 16-Hi 적층 제품도 공개했다.
업계는 SK하이닉스가 CoWoS(Chip-on-Wafer-on-Substrate), MR-MUF(Molded Resin-Microbump Underfill) 등 패키징 기술과 열 확산 구조 설계에서 선도적 우위를 확보한 것으로 평가한다. 이러한 공정 완성도가 엔비디아, AMD 등 대형 고객의 신뢰를 끌어내며 2024~25년 물량이 사실상 ‘완판’된 배경으로 꼽힌다.
■ 마이크론, ‘26년 램프에 ‘전력 효율·원가’ 승부···삼성전자, 검증 신뢰성 회복과 가격 전략
마이크론은 6월 HBM4 샘플(12-Hi, 36GB, 스택당 2TB/s 이상 대역폭)을 출하했다. 다만 본격 양산 시점은 내년 Rubin 플랫폼과 보조를 맞추겠다는 계획이다. 이미 HBM3E를 작년 초부터 양산하며 수익 구조 전환에 성공했고 HBM4에서는 전력 효율성과 원가 경쟁력을 무기로 점유율 확대를 노린다.
업계 관계자는 “마이크론은 미세 공정 최적화와 저전력 설계 역량을 강점으로 삼아, Rubin 전환 시점에서 ‘효율 대비 가격 경쟁력’을 전면에 내세울 것”이라고 분석했다.
삼성은 HBM3E 시장에서 점유율 회복을 위해 최대 30% 가격 인하 카드를 꺼내든 것으로 전해졌다. 단기적으로는 출혈 경쟁이지만, 대형 고객사 물량을 확보해 공급 기반을 넓히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HBM4 검증 신뢰성은 여전히 도전 과제로 남아 있다. 삼성은 앞서 HBM3E 공급 과정에서 주요 고객사 인증 지연으로 시장 점유율을 잠식당한 전례가 있다. 이번에도 공식 확인 부재가 반복되면서 양산 준비에 의문이 제기된다.
글로벌 IB 업계는 “삼성의 HBM4 적기 인증 여부에 대한 시장의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았다”며 “커뮤니케이션 공백이 리스크 프리미엄으로 작용한다”고 경고했다.
■ 기술적 쟁점: 16-Hi 적층, 패키지 높이 완화, 하이브리드 본딩
HBM4 표준(JEDEC JESD238)은 2048bit 인터페이스를 채택해 스택당 2TB/s 이상 대역폭을 지원한다. 하지만 16-Hi 적층 과정에서 발생하는 패키지 높이, 와핑(warping), 발열 밀도 문제는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다.
다만 JEDEC가 HBM4 패키지 높이 규격을 완화하면서 기존 MR-MUF, TC-NCF(Non-Conductive Film) 기반 공정을 유지할 수 있는 여지가 생겼다. 업계 일각에서는 하이브리드 본딩(HB) 기술이 HBM4E부터 본격 도입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이 과정에서 TSV(Through-Silicon Via), 첨단 패키징 캐파(CoWoS, SoIC) 및 파운드리 베이스 다이 공정(예: TSMC 12FFC+, N5) 등이 공급망 병목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 2026년 Rubin 세대⸱⸱⸱멀티벤더 경쟁 불가피
업계는 2026년 엔비디아 루빈(Rubin) 플랫폼 전환 시점을 HBM4 본격 경쟁의 분수령으로 본다. 루빈은 엔비디아의 차차세대 인공지능(AI) 반도체다. 올해 공개한 블랙웰의 후속 제품으로, 내년 출시될 예정이다.
업계에서는 이후 SK하이닉스는 조기 인증과 완성도로 선두를 질주할 것으로, 마이크론은 2026년 본격 램프와 가격·효율 경쟁력으로 점유율 확대를 조준, 삼성전자는 올해 PP→MP 전환 성패에 따라 판도가 갈릴 것으로 각각 전망한다.
한 전문가는 “삼성이 연내 MP에 성공한다면 점유율을 일부 회복할 수 있겠지만, 공식 확인 부재로 신뢰성 리스크가 상존한다”며 “결국 루빈 세대에선 멀티벤더 공급 체제가 확정적일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삼성 HBM4를 둘러싼 ‘예비 테스트 통과’ 보도와 ‘확인 불가’라는 삼성의 태도는 업계에 상반된 신호를 던지고 있다”며 “SK하이닉스와 마이크론이 각각 완성도·효율성이라는 무기를 앞세워 차세대 구도를 준비하는 가운데 삼성은 검증 신뢰성 회복이라는 과제를 안은 채 경쟁에 뛰어들고 있다. 업계의 시선은 결국 2026년 루빈 세대에서의 다자 구도로 모이고 있다”고 밝혔다.
[ⓒ 예결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